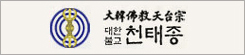불교에는 수많은 진언(眞言)들이 존재한다. 진언은 산스크리트어 만뜨라(mantra). 한문으로는 만달라(曼怛羅), 만다라(曼荼羅) 등으로 음사되거나 주(呪)·신주(神呪)·밀언(密言)이라 불린다. 밀교의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 중 구(口密)에 해당하며, 부처와 보살의 서원(誓願)이나 덕(德), 그 별명(別名)이나 가르침을 간직한 비밀의 어구를 뜻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 등 동양 3국에서는 그 뜻을 번역하지 않고 범어 그대로를 읽고 있다. 이것을 외우고 그 문자를 관하면 그 진언에 응하는 여러 가지 공덕이 생겨나고, 소원의 성취는 물론 성불할 수도 있다고 전한다.
협의로 말할 때는 짧은 주문이 진언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다라니(陀羅尼)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교의식집 속에서 진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천수경의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과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 옴마니반메훔)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진언이다.
 |
| 경명주사 신묘장구대다라니 |
다라니 중 가장 많이 염송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정진을 하다가 다라니 원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기록한 실담문자(悉曇文字)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독학으로 실담학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태고종 법륜사 법헌 스님을 만난 진언 수행과 연구의 대장정을 들었다.
 |
| 한국 실단학의 개척자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법헌 스님 |
태고종 승가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인 법헌 스님은 실담자 연구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독학으로 한국 실담자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중에 한문으로 음사된 경전에 의문을 가지고 실담자로 기록된 원전을 찾아 문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실담자는 싯담(Siddhaṃ)이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완성된" 또는 "완벽한"을 의미한다. 범천(브라흐마)이 만든 문자로 범자 혹은 범어로 불리기도한다.
싯담 문자는 기원후 6세기 후반에 굽타 브라흐미 문자가 기원이다. 아쇼카왕의 석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싯담 문자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비롯하여 아삼 문자, 벵골 문자, 티르후타 문자, 오디아 문자, 네팔 문자 등 여러 문자들로 변화됐다. 동아시아는 싯담 문자가 여전히 사용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경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싯담 문자도 함께 소개됐다. 이 불경에서 기록된 싯담 문자가 중국에서 실담(悉曇)으로 총칭되었다. 이후 당나라 시기의 중국승려 지광(智廣)의 실담자기(悉曇字記)를 저술하여 본격적인 싯담 문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실담자기는 싯담 문자에 대한 문법적 설명과 발음, 문자의 결합 법칙 등을 중국어로 설명해놓았다.
 |
| 실담 종자관 |
일본에서는 쿠카이 대사가 806년 중국에서 돌아와 일본에 실담자기와 싯담 문자를 소개했다. 쿠카이 이후로 실담자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싯담 문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인 '실담학(悉曇學)'이 정립되었다. 오늘날에도 일본은 싯담 문자에 대한 가장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불교 학자들은 한자처럼 싯담 문자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동일한 음운값을 가진 여러 문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 관습은 사실상 중국식 쓰기와 인도식 쓰기의 '혼합'을 나타내며, 싯담 문자에 있는 산스크리트어 문장을 읽었을 때 일본인이 채택한 한자처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문자의 여러 가지 변형이 발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천태종과 진언종의 밀교종파에서 싯담 문자를 이용하여 진언을 사경하고 염송한다. 대정(大正, 다이쇼) 신수 대장경은 싯담 문자를 보존하고 있다.
 |
| 관세음보살 진언 48수 '연화수 진언' |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라니는 신라, 고려시대에 걸쳐 싯담 문자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 시기에 간행된 다수의 진언집(眞言集)이 출간하는 등 싯담 문자에 대한 연구 자체는 이어져왔다. 1565년 안심사본 진언집과 1800년 망월사본 진언집이 전해진다. 이 진언집에는 싯담 문자의 발음과 의미 등이 한문과 한글을 통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법현스님이 처음 실담자를 공부하고자 발원하고 시작했을 때 한국에는 실담을 가르치는 교수도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학자들과 진언에 조예가 있다는 스님들을 찾아다녔지만 체계화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어둠속에서 실로 구슬을 꿰는 막막한 과정을 거쳐 실담자 한자 한자 공부했다. 조선조에 간행된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마리르 찾아나갔다. 어느정도 실담자에 대한 공부를 마친 스님은 자신의 공부가 정확한 것이지를 알고싶었다.
그러던중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실담학의 대가가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비행기를 탔다. 2013년 교토 종지원대학 교수이며 부학장인 고타마기류 스님을 찾아가 그도안 공부한 내용을 보여주니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대역사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타마기류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스님은 이제사 자신의 공부가 허된 방향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본격적인 한국 실담문자 연구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2001년 실담 범자 연구를 시작한 법헌 스님은 2004년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주를 대중 불자들에게 보급시작한다. 2010년에는 실담범자 경전, 진언, 다라니, 주, 등의 보존연구회 창립하고 2012년 경기도 광명시민회관에서 제1회 진언 다라니 필사 전시회 개최한다. 2013년 제2회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필사 전시회를 열었고 2014년 국회의원 초청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2018년 강남대치동 쎄텍 불교박람회에서 실담범자 기초본, 만다라, 42수주진언 등을 전시해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
| 길이 14미터에 이르는 금강경 변상도 부분 |
스님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실담범자 사경집. 광명진언 실담범자 사경집, 실담범어 반야심경 사경집을 발간하고, 실담범어 진언집과 만다라 도상 등을 집필하고 있다.
법헌 스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자들에게 실담범자 강의했고, 양산 부산에서도 실담범자 보급을 위해 앞장섰다.
법헌 스님은 지난해 2022년 실담범자의 권위자인 태고종 법헌 스님이 7월 13일 보신각종을 타종하고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한국실담범자 연구회 창립하고 기념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전시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상진 스님, 광명시불교사암연합회장 상허 스님등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동참해 스님의 실담연구의 결실을 축하했다.
법헌 스님은 오늘도 안산 법륜사에서 실담범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담범자 한자 한자마다 신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범자에는 모든 우주의 에너지 파동이 작동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현교와 밀교의 구성원리가 되는 실담자의 표현과 방식과 진언 주력, 다라니 등에 대한 깊은 학술적 이해와 밀교의 삼밀 수행의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안산 법륜사=특별취재단